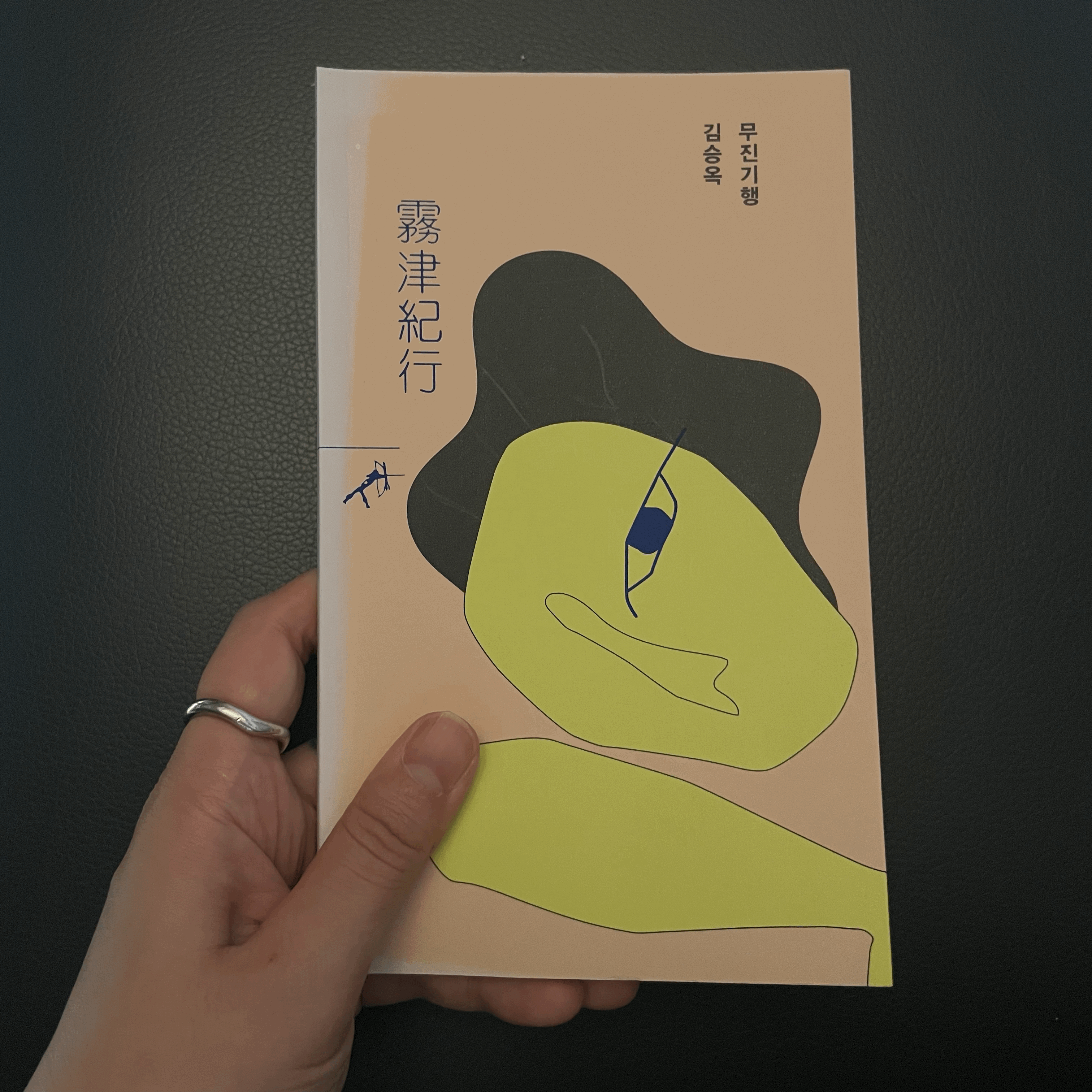
[책 소개]
한국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준 첫 한글세대 소설가 김승옥은 근대인의 일상과 탈일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해 내면서 1960년대 문학에 '감수성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받고 있다. '서울’과 ‘무진’이라는 두 공간 사이에서 그리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해 냄으로써 한국 문학사상 최고의 단편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작가, 김승옥에 대하여]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하고, 1945년 귀국하여 전라남도 순천에서 성장하였다. 순천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였다. 4·19혁명이 일어나던 해인 1960년에 대학에 입학해서 4·19세대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1962년 단편 「생명 연습」이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하였으며, 같은 해 김현, 최하림 등과 더불어 동인지 『산문시대』를 창간하고, 이 동인지에 「건」, 「환상 수첩」 등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문단활동을 시작하였다.
김승옥은 대학 재학 때 『산문시대』 동인으로 활동했으며, 「환상수첩」(1962), 「건」(1962),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1963) 등의 단편을 동인지에 발표했다. 이후 「역사(力士)」(1964), 「무진기행」(1964), 「서울, 1964년 겨울」(1967) 등의 단편을 1960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서울의 달빛 0장」(1977), 「우리들의 낮은 울타리」(1979) 등을 간헐적으로 발표하면서 절필하기 전까지 20여 편의 소설을 남겼다.
1980년 [동아일보]에 장편 「먼지의 방」을 연재하다가 광주민주화운동 소식에 창작 의욕을 상실하고 절필했다. 1999년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부임했지만, 2003년 오랜 친구인 소설가 이문구의 부고를 듣고 뇌졸중으로 교수직을 사임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나타난 문학의 무기력증을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받으며 1960년 대적인 특징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 잡았다. 문학평론가 유종호는 김승옥의 작품에 대해 “감수성의 혁명이다. 그는 우리의 모국어에 새로운 활기와 가능성에의 신뢰를 불어넣었다.”라고 평했다. 그는 「서울, 1964년 겨울」로 제10회 동인문학상을, 「서울의 달빛 0장」으로 제1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김승옥의 소설은 대체로 개인의 꿈과 낭만을 용인하지 않는 관념체계, 사회조직, 일상성, 질서 등에 대한 비판의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성의 관념 체계, 허구화된 제도, 내용 없는 윤리 감각이라는 일상적인 질서로부터 일탈하려는 열망, 곧 아웃사이더를 향한 열정이 김승옥 소설의 중심적이고 일관된 내용이다.
김승옥의 소설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소설은 아웃사이더를 향한 열정이 현실을 압도하는바, 낭만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띤다. 「환상 수첩」, 「확인해 본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 「생명 연습」 등의 초기 소설은 환각이나 환상을 쫓는 삶 혹은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이 두드러진다. 「무진기행」 이후 현실의 엄정한 법칙성을 인정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며, 그의 후기 소설은 초기의 아웃사이더를 향한 열정 대신에 꿈이나 환상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한 환멸과 허무 의지로 가득 찬다.
김승옥의 작품 속 인물들은 반짝이는 빛의 내면과 동시에 속된 일상의 외관을 동시에 지닌 역설적인 인물들이다. 그들은 빛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일상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윤리와 무책임성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1960년대만 유효할 수 있을 뿐이다. 197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왜곡된 근대화의 모순 그리고 이에 대한 응전 방식으로 발화하는 새로운 엄숙주의 앞에서는 무력하게 좌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승옥 소설은 감각적인 문체, 언어의 조응력, 배경과 인물의 적절한 배치, 소설적 완결성 등 소설의 구성원리 면에서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4·19 혁명의 열광적인 분위기를 문학적 언어로 환치시키면서 전후세대 문학의 무기력증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에는 순천문학관에 그의 생애와 문학 사상을 기리기 위한 김승옥관이 마련되기도 했다.
70년대의 기라성 같은 청년작가 김승옥의 단편소설 [무진기행]을 발표했을 때, 아버지는 문인 친구들과 함께 우리집에 모여서 술을 마셨다. 그들은 모두 김승옥이라는 벼락에 맞아 넋이 빠진 상태였다.
"너 김승옥이라고 아니?"
"몰라, 본 적이 없어. 글만 읽었지."
그들은 "김승옥이라는 녀석"의 놀라움을 밤새 이야기하면서 혀를 내둘렀다. 새벽에 아버지는 "이제 우리들 시대는 갔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는 식은 안주를 연탄아궁이에 데워서 가져다 드렸다. 아침에 아버지의 친구들은 나에게 용돈을 몇 푼씩 주고 돌아갔다. -김훈 <라면을 끓이며> 중
김훈 작가의 아버지 역시 작가였다고 한다. 그 시대 김승옥은 문학계의 신성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그들은 모두 김승옥이라는 벼락에 맞아 넋이 빠진 상태였다'라는 부분을 보자 나는 <무진기행>을 읽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김승옥에 빠졌다. 본문 중, 에 쓰여진 내용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고, <무진기행>의 마지막 장이다. 뿌옇고 몽환적인 무진의 도시를 떠나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달콤한 사랑의 꿈에서 깨어야 하는 인간의 슬픔과 고뇌가 나의 입에 씁쓸하게 맴돌게 하는 문장들. 나는 <무진기행>을 본 이후로 안개가 자욱이 낄 시간에 순천에 드라이브 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저 마지막 장을 녹음파일로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나는 곧 깰 환상 일건 알지만 일단 그 환상으로 들어가는 기분에 가슴이 뛰곤 한다.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1) | 2024.01.08 |
|---|---|
| [소설] 청춘, 마광수 (0) | 2022.11.01 |
| [단상집] 우리는 사랑을 사랑해, 김종완 (1) | 2022.10.23 |
| [소설] 헛간을 태우다, 무라카미 하루키 (0) | 2022.10.22 |
| [시]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2) | 2022.10.22 |